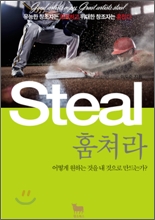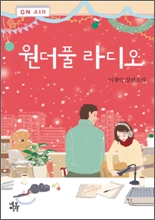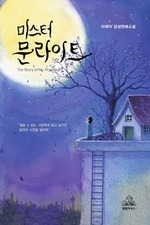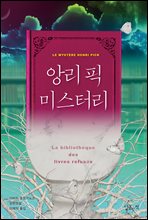아이린
- 저자
- 이재익
- 출판사
- 황소북스
- 출판일
- 2010-12-20
- 등록일
- 2013-09-13
- 파일포맷
- XML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물푸레나무 한 잎같이 쬐그만 여자,
그 한 잎의 여자를 사랑했네. 물푸레나무 그 한 잎의 솜털,
그 한 잎의 맑음, 그 한 잎의 영혼, 그 한 잎의 눈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 듯 보일 듯한 그 한 잎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
- 오규원, <한 잎의 여자> 중에서
주한미군, 양공주, 카투사, 분단, 혼혈… 충격적인 살인사건!
기지촌 여성을 향한 진실하고 애절한 사랑을 그린 로맨틱 스릴러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의 PD로 일하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재익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배경으로 엇갈린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과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실제로 카투사로 군복무했던 작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리얼한 묘사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플롯이 돋보이는 로맨틱 스릴러이다.
소설은 정태라는 서울대 출신의 카투사가 캠프 험프리스에 전입하면서 시작된다. 우연한 기회에 미군전용 클럽에서 일하는 혼혈아인 아이린을 만나게 되고, 둘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이린에게는 로드리게즈라는 미군 장교 애인이 있다. 어느 날, 로드리게즈가 아이린의 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 아이린과 정태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간다.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아이린의 놀라운 과거와 정태의 숨겨진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소설은 클라이맥스로 향한다.
주한 미국대사관 문정관 출신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그의 논문에서 “세계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미국 현지의 반대여론에 부딪치면서도 모든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 한국은 장군에서 졸병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물질적 향락을 만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향락 중에는 몇천, 몇만 명 단위로 공급되는 젊은 여성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적었다.
이 소설은 헨더슨의 주장에 대한 소설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이 작품 안에는 주한미군과 카투사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 분단된 조국에 대한 고뇌와 번민, 정치 성향이 다른 젊은이의 갈등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적 알레고리가 곳곳에 지뢰처럼 숨겨져 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미군에게 몸을 판다”
윤금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기지촌 문학의 결정판!
2011년 고엽제 파문…우리에게 주한미군이란 무엇인가?
기지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우리 문학사에도 더러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안정효의《은마는 오지 않는다》와 복거일의《캠프 세네카의 기지촌》이다. 90년대 초에 출간되어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던 안정효의 소설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바탕으로 전쟁통에 고군분투하며 살아남기 위한 민초의 삶을 금산리라는 기지촌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1994년에 발표되어 토착문화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 사이의 부딪힘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복거일 작품 또한 전후 미군 기지촌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밀도 있게 그리고 있다.
반면 이재익의《아이린》은 IMF라는 국가적인 화마(火魔)가 지나간 1997년과 세기말을 그 무대로 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두 선배 소설가들이 기지촌을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서술했다면 이재익의《아이린》은 실제로 카투사로 근무했던 작가의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리얼하고 생동감 있는 소설적 세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재익과 두 선배 소설가의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카투사(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란 미8군에 증강된 한국육군요원을 지칭하는 말로 주한 미8군의 각 부대에서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육군 소속의 요원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 카투사들은 한국의 지리, 언어, 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임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가 왜 한국이야? 여긴 미군기지라고. 캠프 험프리스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나 알고 떠들어? 니네 한국 정부의 기록에도 여긴 캘리포니아 주로 되어 있어. 너희를 지휘하는 게 누구야? 캐슬 대령이지? 니들 생활을 누가 통제해? 중대장 제니랑 인사계 데이비스잖아. 니네들이 영어를 쓰는 게 더 당연하지. 병신아 똑똑히 알아둬. 여기는 미국땅이야. (…) 너도 알잖아. 우리 미국이 없었다면 너희는 지금쯤 북한사람들처럼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겠지. 여긴 미국이야.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불쌍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한 미국의 기지란 말이야, 이 좆대가리야.”
―본문 중에서
이 작품은 이른바 ‘오렌지족’ 혹은 ‘신세대’라고 불리었던 한 젊은이가 일본 식민지, 한국전쟁과 주한미군, 징병제도, 북한과의 대립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슬픈 단면을 상징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소설!
한미간의 다양한 문제를 문학적 알레고리로 승화시킨 작품!
이 작품에서 작가는 ‘아이린’이라는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등장시킨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 지칭되는 서울대 출신의 정태라는 카투사와 클럽에서 몸을 파는 아이린과의 만남과 사랑을 통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미간의 대립과 반목을 넘어선 화합과 평화이다. 그래서인지 이 소설의 핵심어인 ‘분단’과 ‘혼혈’이라는 두 단어는 묘한 대비와 울림을 준다.
기지촌 사람들. 그들은 미군의 폭력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군기지 주변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가끔 사회면에 오르내리지만 그 시절에는 살인과 강간, 폭행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군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지요. 한국 정부와 미군 사이에 맺은 SOFA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 군복무를 하는 내내 빚을 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미군 주둔의 달콤한 열매를 따먹는 동안 수많은 윤금이, 가난해서 무지해서 기지촌에 흘러들어온 그녀들은 무방비로 다치고 죽어나갔으니까요. 제대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채무감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 안보라는 거대 명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정의로움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반성해보자는 겁니다. 이 소설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군과의 관계가 조금 더 정의롭게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이 합당해야 죄도 줄어들고 그 죄로 고통 받는 이들도 줄어들겠지요.
―<작가의 글> 중에서
이 소설은 대중적인 소설 플롯과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다. ‘페이지터너’라는 애칭답게 쉽고 빠르게 읽힌다. 하지만 첫 장의 윤금이 사건과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왠지 가슴이 한동안 먹먹해진다. 그건 이 소설이 내면에 감추고 있는 무거운 현실과 아무리 몸부림치고 외면하려고 해도 엄연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뼈아픈 근현대사 때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인터파크에서 연재중인 세계2차대전을 배경으로 한 남자의 기구한 운명을 다루고 있는 대서사시인 ≪아버지의 길≫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줄거리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이곳은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주소지가 되어 있다. 주인공 정태는 카투사로 이곳에 전입해 온다. 우연한 기회에 미군전용클럽에서 일하는 혼혈아인 아이린을 만나게 되고, 둘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이린에게는 로드리게즈라는 미군 장교 애인이 있다.
어느 날, 로드리게즈가 아이린의 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 아이린과 정태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간다.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아이린의 놀라운 과거와 정태의 숨겨진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소설은 클라이맥스로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