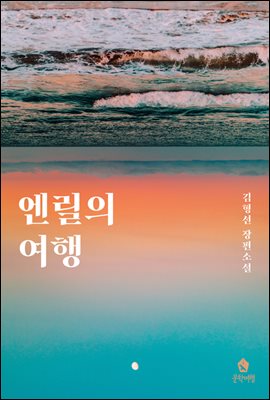그 어디에도
- 저자
- 이재훈 저
- 출판사
- 문학여행
- 출판일
- 2018-03-10
- 등록일
- 2018-07-11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18MB
- 공급사
- 예스이십사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이것은 자발적으로 썩어가는 한 생명의 자국이다. 주인공은 선천적으로 상처받는 일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이다. 그래서 홀로 숨어 침묵에 잠기는 쪽이 항상 편했다. 그런 주인공은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라는 껍데기를 얻지 못했고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작은 방이라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주인공에게는 당연한 장면이었다. 삶은 태초에 텅 비어있었고 고로 유약한 주인공의 삶은 껍데기가 없으면 존재 할 수 없는 ‘무엇’으로서 언제나 고통에 시달렸다. 결국 주인공은 세상 가장 조용히,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며 스스로 토해낸 끔찍한 고통에 몸을 박박 문지른다. 그러나 그는 평균적으로 평범하고 괜찮은 인간의 집합에 속해있다는 사실에 더욱 찢어지며 자기연민에 심취한다. 자신의 불행과 비극마저도 기름지고 평범하다는 사실에 무너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살고 있는 방은 점차 번데기 껍질처럼 굳어간다. 모든 죄가 그의 등짝 위로 쏟아졌고 그에게 방문은 열려있어도 닫힌 것이 된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구원은 작은 노트북의 화면 속 세상이다. 화면 속 세상에 몰입해 하얗게 질려갈 때, 마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망각할 정도로 하얗게 없어질 때 그는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낀다. 그는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불편했고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서 몰래 존재하길 원했다. 가상세계에의 중독이 결국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삶을 파괴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는 당장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친 듯이 화면 속 가상세계에 모든 것을 던져 넣는다. 혹여 모니터의 불이 꺼질 새라 자신이 가진 전부를 쏟아 붓는다. 그렇게 조금씩 서서히 무너지며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폐허가 되어간다. 방 안에 숨어 끊임없이 자기연민을 뿜어내며 번데기 세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 결말은 끔찍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면서도 그 결말이 내일은 아니라는 사실에 기생하며 하루하루를 덜컥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을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내일에 겨우 빌붙던 그는 마침내 부모님과 약속한 ‘그 날’을 마주한다. 더 이상 내일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그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비참하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번데기 속에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몰래 썩어가던 그는, 결국 부끄러운 몸을 꺼내 보이는 대신 죽음을 택하기로 마음먹는다. 죽음보다 상처받는 일이 더 아플 정도로 그는 볼품없이 망가진 존재였다. 마침내 ‘그 어디에도’ 그가 편히 머물 곳은 사라졌고, 마치 쫓겨나듯 스스로 방문을 벗어나게 된다. 존재이유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파랗고 둥글게 몸을 감싸 안으며 죽어간다. 그리고 조용히 어느 쓸쓸한 아파트 단지 옥상 위에 올라 생을 마무리 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나약한 잘못으로서, 모든 미움을 끌어안고 한 방울 떨어져 박살난다. 최후에 최후까지 최악만을 골라 저지르며 가장 못난 삶으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다. 결코 용서담지 못할 몸이길 원하며, 오직 미움만 가슴에 가득 끌어안고.
그리하여 이곳 하얀 백지 위에서 마침내 이해당하고 용서받으며 여전히 있지만 없는 것으로서 고요히 녹아 부활한다.